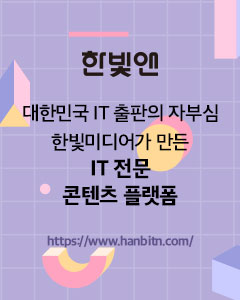IT/모바일
프로그래밍은 상상이다 - 엥겔바트가 보여준 상상력과 통찰력의 정수, 하이퍼텍스트와 마우스
제공 : 한빛 네트워크
저자 : 임백준
출처 : 프로그래밍은 상상이다 제5장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사회 중에서"
 한국에 컴퓨터가 처음 소개된 것은 언제였을까?
한국에 컴퓨터가 처음 소개된 것은 언제였을까?
전자신문사에서 나온“처음 쓰는 한국 컴퓨터사”에 보면 (논쟁의 소지는 있지만) 1967년 4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인구센서스 통계를 위해 도입한“IBM 1401”이 최초의 컴퓨터였다고 한다. 당시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에 의하면 이 컴퓨터의 가격은 40만 달러 정도였고, 기억 용량은 16KB 수준이었다. 요즘 PC의 기억 용량이 대략 128MB라고 했을 때, IBM 1401의 기억 용량은 요즘 PC의 8000분의 1에 불과했던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컴퓨터를 처음 만들어낸 것은 언제였을까? 놀랍게도 그것은 컴퓨터가 수입되기 이전인 1964년이다. 60년대 초 한양대 전자공학과의 이만영 교수가‘전자관식 아날로그 계산기 1, 2, 3호’를 개발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컴퓨터라고 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정밀계산을 수행하는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컴퓨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물관으로 직행하였다. 그러한 컴퓨터가 사용될 수 있는 최적의 분야는 항공기, 레이더, 유도탄 등과 같은 군수품이지만 한국은 그러한 무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할만한 역량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이 무렵의 기록 사진을 보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지나치게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이 이채롭다. 컴퓨터를 알지 못했을 그가 숫자와 알파벳만이 단조롭게 깜빡이는 모니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 박정희가 과학기술처 순시를 하던 중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 하나가 있다. 컴퓨터 화면 앞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소와 닭이 몇 마리씩인가 하고 물었는데, 누군가 즉시“컴퓨터를 이용해서”라고 말하면서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대답하여 실소를 자아내었다고 한다. 컴퓨터는 소나 닭의 머리수를 세는 장치가 아니며, 설령 그 수를 센다고 하더라도 끝자리 숫자까지 맞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컴퓨터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가던 이 시기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실로 의미심장한 두 가지 발명이 세상에 선을 보였다. 그 두 가지 발명이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마우스(mouse)와 하이퍼텍스트(hypertext)이다. 키보드와 함께 컴퓨터 입력 장치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마우스는 더그 엥겔바트(Doug Engelbart)에 의해서 발명되었다. 이 발명품이 진짜 놀라운 점은 그가 마우스를 발명한 60년대 후반에는 오늘날과 같은 그래픽 위주의 컴퓨터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지 않았었다는 사실이다.
그 당시에는 흑백 화면 위에 깨알같이 뿌려지는 글자를 보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의 전부였다.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나 권력자가 아닌 사람들은 단조로운 흑백 모니터나마 구경할 기회도 없었던 시절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마우스를 발명했다는 것은 마치 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전구를 발명한 것처럼 실로 기발한 상상력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그가 마우스를 개발한 동기는 하이퍼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손쉽게 편집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문자 위주로 구성된 화면을 위해서 마우스를 고안했다는 사실은 그의 비범함을 더욱 잘 드러낸다. 훗날 철학자들은 마우스가 제공하는 편리성만이 아니라 마우스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컴퓨터와 인간 사이의 ‘촉감의 나눔’에도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였다. 마우스로 컴퓨터를 조작할 때 우리의 손바닥이 컴퓨터를‘마사지’하듯이 어루만지기 때문이다.

엥겔바트는 1925년에 태어나서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자라났다. 그는 오레건 주립대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하다가 2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해군으로 참전하여 레이저 기술자로 복무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버클리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실리콘밸리의 스탠포드 연구소(SRI)에서 인간이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그가 발명한 획기적인 개념들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많다. 그 중에는 컴퓨터 화면에 여러 개의 창(윈도우)을 띄워 놓고 작업하기, 컴퓨터를 통한 화상회의, 컴퓨터를 통한 문서 공유 등과 같이 현재의 우리가 구체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도 존재한다.
그러나 엥겔바트의 상상력과 통찰력의 정수를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는 사건은 하이퍼텍스트의 발명이다. 그는 인터넷이 미처 걸음마도 시작하지 않았던 시기에 이미 하이퍼텍스트를 통한 사이버스페이스의 건설을‘상상’하였다. 그는 컴퓨터가 인류의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는 도구로서 인간 지능의 자연스러운 연장이라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인간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엥겔바트 철학의 핵심이었다. (이것은 컴퓨터를 인간 중추 신경계의 외화로 파악한 마샬 맥루한의 시각과 통한다.)
웹 페이지에서 보통 밑줄이 그어져 있는 파란 색 글자를 마우스로 누르면 그 글자에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페이지가 나타난다. (이러한 파란 글자를 ‘링크’혹은‘하이퍼텍스트’라고 부른다.) 새롭게 나타난 페이지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PC 안에 있을 수도 있고, 학교나 회사의 컴퓨터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름 모를 컴퓨터 안에 있을 수도 있다. 그 렇지만 그 페이지가 실제로 어디에 존재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컴퓨터 사용자에게 그 두 페이지는 한 권의 책 안에서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바로 이것이 엥겔바트의 통찰이고,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서 체험하고 있다. 그의 통찰 속에는 사실 우리가 오늘날 접하고 있는 하이퍼텍스트의 개념을 뛰어넘는 부분도 있다. 즉, 우리의 현실이 그의 상상을 미처 다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 최초의“로그인”이 UCLA와 스탠포드에 있는 컴퓨터 사이에서 실현되었던 것이 1969년 10월의 일이었던 한편, 엥겔바트와 SRI의 연구원들이 마우스와 하이퍼텍스트를 세상에 소개한 것은 1968년의 일이었다. 이렇듯 그의 발명들은 컴퓨터 선진국인 미국에서조차도 너무 빨랐기 때문에 그의 발명 중에서 많은 것들이‘박물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잠시‘창고’신세 정도는 져야만 했다. 돌이켜보건대 30여 년 뒤의 후배들이 함량미달의‘발명품’을 가지고 한 푼의 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것에 비하면, 엥겔바트의 처신은 의연하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했다. 그는 자신의 발명품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비영리 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후배 연구원, 엔지니어들에게 대가에 대한 존경심을 품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우리나라에도 엥겔바트보다 못하지 않은 대가가 많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대가의 표정을 지으며 세인의 존경을 받다가, 때다 싶으면 그 존경을 팔아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정치판’이나‘코스닥’을 기웃거리는 가짜 대가들도 많다는 사실이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밖에서는 근엄한 얼굴로 세상 고민 다 짊어지고 사는 듯 온갖 표정을 잡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컴퓨터로 소나 닭의 머리나 셀 생각을 하지 않을까.
- 뉴스앤조이 USA, 2001년
저자 : 임백준
출처 : 프로그래밍은 상상이다 제5장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사회 중에서"
 한국에 컴퓨터가 처음 소개된 것은 언제였을까?
한국에 컴퓨터가 처음 소개된 것은 언제였을까?
전자신문사에서 나온“처음 쓰는 한국 컴퓨터사”에 보면 (논쟁의 소지는 있지만) 1967년 4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인구센서스 통계를 위해 도입한“IBM 1401”이 최초의 컴퓨터였다고 한다. 당시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에 의하면 이 컴퓨터의 가격은 40만 달러 정도였고, 기억 용량은 16KB 수준이었다. 요즘 PC의 기억 용량이 대략 128MB라고 했을 때, IBM 1401의 기억 용량은 요즘 PC의 8000분의 1에 불과했던 셈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컴퓨터를 처음 만들어낸 것은 언제였을까? 놀랍게도 그것은 컴퓨터가 수입되기 이전인 1964년이다. 60년대 초 한양대 전자공학과의 이만영 교수가‘전자관식 아날로그 계산기 1, 2, 3호’를 개발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컴퓨터라고 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정밀계산을 수행하는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컴퓨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박물관으로 직행하였다. 그러한 컴퓨터가 사용될 수 있는 최적의 분야는 항공기, 레이더, 유도탄 등과 같은 군수품이지만 한국은 그러한 무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할만한 역량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이 무렵의 기록 사진을 보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지나치게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이 이채롭다. 컴퓨터를 알지 못했을 그가 숫자와 알파벳만이 단조롭게 깜빡이는 모니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 박정희가 과학기술처 순시를 하던 중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 하나가 있다. 컴퓨터 화면 앞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소와 닭이 몇 마리씩인가 하고 물었는데, 누군가 즉시“컴퓨터를 이용해서”라고 말하면서 끝자리까지 정확하게 대답하여 실소를 자아내었다고 한다. 컴퓨터는 소나 닭의 머리수를 세는 장치가 아니며, 설령 그 수를 센다고 하더라도 끝자리 숫자까지 맞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컴퓨터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가던 이 시기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실로 의미심장한 두 가지 발명이 세상에 선을 보였다. 그 두 가지 발명이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마우스(mouse)와 하이퍼텍스트(hypertext)이다. 키보드와 함께 컴퓨터 입력 장치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마우스는 더그 엥겔바트(Doug Engelbart)에 의해서 발명되었다. 이 발명품이 진짜 놀라운 점은 그가 마우스를 발명한 60년대 후반에는 오늘날과 같은 그래픽 위주의 컴퓨터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지 않았었다는 사실이다.
그 당시에는 흑백 화면 위에 깨알같이 뿌려지는 글자를 보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의 전부였다.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나 권력자가 아닌 사람들은 단조로운 흑백 모니터나마 구경할 기회도 없었던 시절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마우스를 발명했다는 것은 마치 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전구를 발명한 것처럼 실로 기발한 상상력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그가 마우스를 개발한 동기는 하이퍼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손쉽게 편집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문자 위주로 구성된 화면을 위해서 마우스를 고안했다는 사실은 그의 비범함을 더욱 잘 드러낸다. 훗날 철학자들은 마우스가 제공하는 편리성만이 아니라 마우스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컴퓨터와 인간 사이의 ‘촉감의 나눔’에도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였다. 마우스로 컴퓨터를 조작할 때 우리의 손바닥이 컴퓨터를‘마사지’하듯이 어루만지기 때문이다.

엥겔바트는 1925년에 태어나서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자라났다. 그는 오레건 주립대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하다가 2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해군으로 참전하여 레이저 기술자로 복무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버클리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실리콘밸리의 스탠포드 연구소(SRI)에서 인간이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그가 발명한 획기적인 개념들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을 만큼 많다. 그 중에는 컴퓨터 화면에 여러 개의 창(윈도우)을 띄워 놓고 작업하기, 컴퓨터를 통한 화상회의, 컴퓨터를 통한 문서 공유 등과 같이 현재의 우리가 구체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도 존재한다.
그러나 엥겔바트의 상상력과 통찰력의 정수를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는 사건은 하이퍼텍스트의 발명이다. 그는 인터넷이 미처 걸음마도 시작하지 않았던 시기에 이미 하이퍼텍스트를 통한 사이버스페이스의 건설을‘상상’하였다. 그는 컴퓨터가 인류의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는 도구로서 인간 지능의 자연스러운 연장이라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인간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엥겔바트 철학의 핵심이었다. (이것은 컴퓨터를 인간 중추 신경계의 외화로 파악한 마샬 맥루한의 시각과 통한다.)
웹 페이지에서 보통 밑줄이 그어져 있는 파란 색 글자를 마우스로 누르면 그 글자에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페이지가 나타난다. (이러한 파란 글자를 ‘링크’혹은‘하이퍼텍스트’라고 부른다.) 새롭게 나타난 페이지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PC 안에 있을 수도 있고, 학교나 회사의 컴퓨터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름 모를 컴퓨터 안에 있을 수도 있다. 그 렇지만 그 페이지가 실제로 어디에 존재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컴퓨터 사용자에게 그 두 페이지는 한 권의 책 안에서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바로 이것이 엥겔바트의 통찰이고,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서 체험하고 있다. 그의 통찰 속에는 사실 우리가 오늘날 접하고 있는 하이퍼텍스트의 개념을 뛰어넘는 부분도 있다. 즉, 우리의 현실이 그의 상상을 미처 다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 최초의“로그인”이 UCLA와 스탠포드에 있는 컴퓨터 사이에서 실현되었던 것이 1969년 10월의 일이었던 한편, 엥겔바트와 SRI의 연구원들이 마우스와 하이퍼텍스트를 세상에 소개한 것은 1968년의 일이었다. 이렇듯 그의 발명들은 컴퓨터 선진국인 미국에서조차도 너무 빨랐기 때문에 그의 발명 중에서 많은 것들이‘박물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잠시‘창고’신세 정도는 져야만 했다. 돌이켜보건대 30여 년 뒤의 후배들이 함량미달의‘발명품’을 가지고 한 푼의 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것에 비하면, 엥겔바트의 처신은 의연하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했다. 그는 자신의 발명품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비영리 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후배 연구원, 엔지니어들에게 대가에 대한 존경심을 품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우리나라에도 엥겔바트보다 못하지 않은 대가가 많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대가의 표정을 지으며 세인의 존경을 받다가, 때다 싶으면 그 존경을 팔아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정치판’이나‘코스닥’을 기웃거리는 가짜 대가들도 많다는 사실이다. 아마 그런 사람들은 밖에서는 근엄한 얼굴로 세상 고민 다 짊어지고 사는 듯 온갖 표정을 잡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컴퓨터로 소나 닭의 머리나 셀 생각을 하지 않을까.
- 뉴스앤조이 USA, 2001년
TAG :
최신 콘텐츠